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내 건설업계가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시공능력평가(이후 시평) 58위 신동아건설에 이어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줄도산' 공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은 지난달 10일 조합의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중단했다. 2021년 8월 착공한 이 공사의 총공사비는 약 1528억원으로 현재 미지급 규모는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L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며 "공사비 지급과 향후 자금 계획 마련 없이는 공사 재개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DL건설이 공사 중단을 결단한 사례는 향후에도 늘어난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보면 DL건설의 지난해 3분기 미청구공사액은 3161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약 11% 증가했다. 또한 발주처에 청구했으나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매출채권)도 4984억원에 달하며 1분기 만에 약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의 미청구금액과 미수금 적체가 심화되면서 유동성 위기로 번지고 있다.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7일에는 시평 103위 대저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평 58위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0여 일 만이다. 대저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미수금이 증가한 가운데 공동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연쇄 타격을 입으며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경기 시흥 신천동 오피스텔 개발사업에서만 3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신동아건설과 공동 시공을 맡은 사업으로 신동아건설 역시 해당 사업장에서 미수금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의 공사 미수금은 2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급증했다.
중견 건설사들은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인해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신동아건설의 부채총계는 2020년 말 3000억원 미만에서 2023년 말 766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98%에서 410%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 100~150%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200%를 초과하면 위험 수준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상위 30위권 내 주요 건설사 중 절반 가까이가 부채비율이 위험 수준을 넘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부채비율 747%) △금호건설(640%) △코오롱글로벌(559%) △HL디앤아이한라(269%) △SK에코플랜트(251%) △동부건설(249%) △GS건설(238%) △계룡건설산업(231%) △한신공영(220%) △롯데건설(217%) △대우건설(196%)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건설사 중 일부는 미청구공사액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겪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47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했다. 이어 계룡건설산업(2232억원·19.0%↑), 금호건설(1659억원·17.3%↑), HL디앤아이한라(1878억원·11.3%↑) 순으로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 건설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은 1069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감소폭이 68.2%로 가장 컸다. 이어 HL디앤아이한라는 177억원으로 57.0% 감소, 한신공영은 1921억원으로 38.0%, 금호건설은 1272억원으로 15.1% 감소했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미청구금액과 미수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업계의 유동성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등한 공사비가 안정화되고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며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야 하지만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동성을 회복하지 못해 부도나는 건설사 수가 2021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장기화되는 분양 경기 부진과 공사 미수금 누적으로 인해 신용도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 및 비주택 미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 미수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PF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시멘트업계, 올해도 침체 지속···수요 급감·원가 부담에 '한숨'
- '시평 58위'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중견사 줄도산 공포 재점화
-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 올해만 건설사 27곳 부도···2019년 이후 최다
- 자금난에 공사중단 사업장 잇따라 공매···낙찰은 '0'건
- 대우건설, 작년 영업익 4031억원···전년比 39% 감소
- 금호건설, 작년 4분기 영업익 55억원···흑자전환
- 롯데건설, 이산화탄소로 굳히는 시멘트 현장적용
- 동부건설,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 대우건설, CDP 기후변화대응 최고등급 '리더십 A' 획득
- 입주 코앞 '메이플자이' 공사비 갈등···GS건설 "4900억 더 달라"
- [CEO&뉴스] 첫 해 '합격점' 허윤홍 GS건설 대표, 수익성 개선 박차
- 태영건설, 작년 영업이익 151억원···흑자 전환
- 1월 취업자 13만5천명↑···건설업 '17만↓' 최대폭 감소
- 입주 코앞 터진 공사비 갈등···강남권 단지들 '화들짝'
- 오피스텔 월세 수요 늘자 수익률까지 '쑥쑥'
- 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직접 사들인다
- 국내 건설업 면허 1호 삼부토건도 법정관리행
- 올들어 중견건설사 5곳 법정관리行···고조되는 건설업계 위기감
- HL D&I한라,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사업' 수주
- '시공능력 180위' 벽산엔지니어링도 법정관리 신청
- 법원, '시공능력 71위'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기자수첩] 미분양이 부추긴 건설업계의 위기
- 미분양·부채에 흔들리는 건설사들···'7월 위기설' 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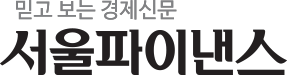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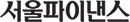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에너지탄소포럼]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9_413212_059_1764126061_2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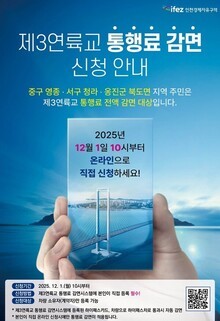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