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박영선 기자] BNK·JB·iM 등 지방금융지주 3사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고전한 반면, iM금융지주는 iM뱅크의 호실적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2495억2300만원)대비 33.2%나 줄어든 1666억원을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NPL)과 연체율도 악화됐다. BNK금융지주의 NPL은 올해 3월말 기준 1.69%로, 직전분기와 비교해 0.38%p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연체율 또한 1.12%로 동기간 대비 0.18%p 올랐다.
JB금융지주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JB금융지주는 지난달 24일 실적을 발표에서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1732억원)대비 6.0% 하락한 1628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이익률(ROA)은 각각 11.6%, 0.99%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 0.07% 하락했다. 아울러 이자이익도 4914억원으로, 전년동기(4966억원)과 비교해 1.05% 줄었다.
다만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전 대구은행)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iM금융그룹은 올해 3월 사명 변경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출범을 알린 바 있다. 최근 iM뱅크는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강원권까지 권역 확대를 모색중이지만, 여전히 대구·경북권에 실적 기반을 두고 있다.
iM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543억원으로 전년동기(1171억원) 대비 38.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대손충당금을 확대 적립해 적자 요인이 발생했지만, iM증권이 5개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지방금융지주 두 곳의 실적이 모두 내림세를 보인 것은 지방은행의 순이익 저하 영향으로 읽힌다. 특히, 지방은행들의 대손비용에 따라 실적 향방이 결정된 모습이다.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부산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1252억원)과 비교해 34.9% 줄어든 1484억원을 기록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387억원으로 전년동기(714억원)대비 9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은 동기간(1012억원)대비 31.4% 하락한 101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632억원으로 2024년동기(299억원)과 비교해 111.4% 증가했다.
이자이익 흐름은 엇갈렸다. 부산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84%로 직전분기(1.85%)대비 내렸지만, 경남은행은 1.83%를 기록해 직전분기(1.82%)대비 소폭 회복했다.
JB금융지주도 주요 계열사 은행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타격을 면치 못했다.
전북은행의 경우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515억원으로 전년동기(508억원)과 비교해 18.3% 줄었다. 누적 대손비용률도 1분기 기준 0.96%로 전년 동기(0.84%) 대비 올랐다.
광주은행의 경우 올해 1분기 순이익 670억원을 기록, 직전년도(733억원)과 비교해 8.7% 감소했다. 누적 대손비용률은 0.65%를 기록, 전년동기(0.65%)와 비교해 감소세다. 다만 누적 판관비가 954억원으로 전년동기(939억원)에 견줘 확대됐고, 누적이익경비율이 43.7%로 전년동기(41.1%p)와 비교해 상승했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난해 2분기 이익경비율이 36.8%, 3분기 36.1%로 축소 양상에 접어들었지만 4분기 39.6%로 올라오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iM금융지주의 경우 iM뱅크의 호실적이 주목됐다. iM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2024년(1195억원)과 비교해 4.7% 오른 1195억원을 기록했다. 충당금전입액은 올해 1분기 기준 611억원으로, 전년동기(982억원)에 견줘 60.7% 축소됐다. 2024년 1분기 472억원이었던 가계부문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33억원으로 큰폭 줄어들었고, 기업부문도 471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542억원) 대비 13% 줄어든 영향이다.
이처럼 경기 악화로 인한 대손충당금 타격으로 실적 희비가 엇갈리자,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이 탄탄한 업권 충성도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지방은행은 디지털금융 부문에서 시중은행과 견줘 편의성이 떨어지고, 지방 인구의 감소세도 확연한 추세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나이스신용평가 이혁준 금융SF평가본부 본부장은 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총자산이 작아 규모 경제 확대에 따른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하다"며 "IT 비용과 같은 고정성 경비는 총자산이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자산규모가 더 작은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더 높은 비율의 판관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영업 확대, 해외진출, 비대면 대출 확대 등의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금융은 규모 경쟁이라 투자 여력과 조달금리 부문에서 격차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우 외국인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특화점포 운영, 외국인 개인대출과 외화 서비스 확대 등 외국인 전용 대출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며 "경기도권 못지 않게 제조업 종사자도 많아 해당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덧붙였다.
- "256만 외국인 모셔라"···지방은행, 특화점포·맞춤형 서비스 '박차'
- 캠코, 2172억원 규모 지방은행 금융안정 지원펀드 조성
- 국내은행 '깜짝 실적', 1분기 순익 6.9조···ELS 기저효과·이자익 감소
- iM금융, 주주가치 제고 '집중'···연일 신고가 경신
- iM금융그룹, HD현대인프라코어와 글로벌 사업 맞손
- 11개 금융그룹 자산 10년새 2배 증가···KB금융 1위
- JB금융지주, 2분기 순이익 2669억원···전년比 3.1%↑
- JB·iM '호호', BNK '주춤'···지방금융3사 상반기 실적 희비, 왜?
- 시중은행에 치이고 인뱅에 밀리고···내리막길 지방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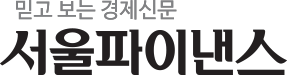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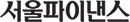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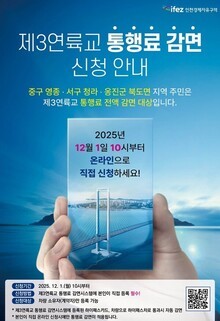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