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내스 박조아 기자] 달러 약세와 저금리, 저유가 등 40년 만의 '3저(低) 환경'이 재연되면서 한국 증시가 장기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지목됐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위한 세미나'에서 '40년 만의 상승장 진입 - 내년 주식시장 및 반도체 전망을 중심으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달러 약세, 저금리, 저유가 등 40년 만의 3저 호황 재연으로 한국 증시가 50년 역사상 3번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 코스피 5000p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2028년 이후에는 7500p 이상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대세 상승장은 1985년, 2003년에 급등하며 발생했고, 평균 상승 기간 3년 이상 지속됐다"며 "코스피는 지난 43년간 횡보장이었고, 이번 연도가 한국 증시 50년 역사의 3번째 상승장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2025~2026년에 반도체 슈퍼호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의 고성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26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을 401조원으로 추정하는데 이 중 107조원이 증가분이며,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몫이 74조원으로, 반도체가 전체 이익 증가의 61%를 차지한다"며 "미국 마이크론보다 실적과 기술 면에서 우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반도체 업체 이익이 증가해 연초 대비 올랐지만, 건전한 조정을 거쳐 추가 상승할 것"이라며 "반도체 업체에 대한 장기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뒤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리서치 센터장들이 참석해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 정책 마련과 세제 혜택, 규제 혁신 등 친기업 정책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가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가 해외로 많이 이전하게 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전체 잠재 성장률이 0%에 도달하는 시기를 2050년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속도가 좀 더 가속화 된다면 이 시기는 5~10년 정도 앞당겨 질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선별된 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정책이 펼쳐지게 된다면, 코스피 5000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센터장은 "최근 AI에 반도체가 필요하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정부의 시장 관련 제도적 노력이 있어도, 주가는 기업 펀더멘털에 좌우되기 때문에 한국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규제 혁신 등을 빠르게 추진해 기업을 지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좋은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은 당연히 연구개발(R&D)과 기술력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의 성장에 달려있다"며 "문제는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의 혁신을 규제가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 방식, 인력운용 등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관리하려 하면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는 감당 어려워진다"며 "첨단산업에서는 관리가 아니라 규제를 정말 혁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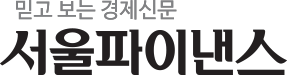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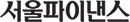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시흥소식] 시화방조제 자전거길에 '디자인 태양광발전' 조성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651_413161_1154_1764076314_2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