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단기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산과 대구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움직임이 감지된다.
다만 매수우위지수의 변동성과 현재 지방 미분양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지방 대도시 전역으로 확산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서울파이낸스가 최근 3주간(10월 13일 이후) KB부동산 아파트 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산의 주간 매매 지표는 0.01%→0.03%→0.02%로 등락을 보였고, 대구는 -0.02%→0.01%→-0.02%로 일정하지 않았다. 다만 부산은 동래구(0.30%), 수영구(0.27%), 연제구(0.21%), 남구(0.07%) 등 일부 지역에서 투자 수요가 집중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자료를 보면,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55㎡ A는 4월 5억6000만원에서 10월 7억500만원으로 거래됐고, 남천금호어울림 더비치 112㎡는 2월 8억1600만원에서 10월 10억4500만원으로 상승했다. 남천자이 111㎡ A는 10월 17일 12억5000만원에 거래된 뒤 일주일 만에 15억6000만원에 팔리는 등 일부 단지에서 단기간 급등세가 나타났다.
대구 부동산 시장도 수성구를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유명 학군지로 수요가 많은 범어동에서는 수성범어 W의 114㎡ A가 직전 달 15억5000만원에서 18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고, 힐스테이트 범어 110㎡는 16억6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쌍용더플래티넘범어 114㎡도 10월 10억4300만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회복 조짐이 보인다. 9월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426건으로 전월(2509건)보다 35.6% 증가했다. 대구 역시 3203건으로 전월(2849건) 대비 12.4% 늘며 거래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핵심 외 지역은 여전히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미분양과 공급 예정 물량 등 수급 변수도 남아 있어 단기 거래 증가와 신고가만으로 시장 회복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최근 3주간 KB부동산이 발표한 매수우위지수는 부산이 23.2→23.4→22.5, 대구가 19.3→17.7→17.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매수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활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방 비중이 크다. 특히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84.4%(2만2992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부산(274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9월 기준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7316가구로 전월(7146가구)보다 2.4% 증가하며 두 달 연속 7000가구 이상을 기록했다.
대구 역시 착공과 분양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전달보다 약 30가구 줄며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22년 1~9월 1만2691가구였던 착공 물량은 2023년 1144가구, 2024년 2249가구로 줄었고, 올해는 734가구로 2022년 대비 약 94% 감소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투자 목적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서울에 비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역별 수급 여건과 시장 흐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입주 물량, 인구,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며, 사실상 다극화된 상태"라며 "전국이 한 흐름으로 움직이던 과거의 동조화 현상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외부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동안 대구와 부산의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핵심 단지, 즉 '대장주'를 중심으로 일부 회복세가 나타난 것일 뿐, 수도권 투기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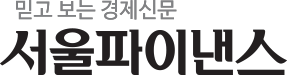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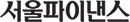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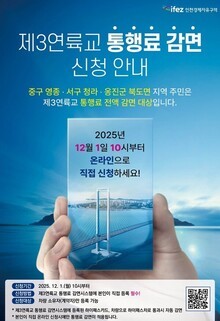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