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목표로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인력난 속에서 수천억원대의 안전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 제재 위주의 법안은 업계 활력 저하와 인재 이탈, 사회적 비용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2021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건설업 현장의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업정지 기준을 '연간 3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했으며,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받은 기업이 다시 사고를 내면 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해당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다.
여기에 금융·투자 제재도 포함돼, 대출금리 상승, 보험료 인상, 보증 심사 불이익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과 형사판결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해 정보 공개 확대에 따른 투자 축소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국내 산재 사망률 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가 뚜렷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나친 '엄벌주의'가 오히려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없이 나온 이번 대책은 건설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중소형 건설사의 경영 부담을 과도하게 높여 안전 강화보다는 법 회피와 보여주기식 대응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질적 근로자 안전 확보보다 처벌과 단속에 편향된 정책은 오히려 현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단 교수 역시 "이번 대책은 사고 예방보다는 규제 강화에 치중해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질적 효과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 폐업이나 사업 전환 증가, 대기업의 인력 감축 및 스마트 건설 확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이은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이유로 엄격한 규제를 불가피한 조치로 소개하지만, 업계는 준비된 안전 투자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반발한다.
이미 대기업들이 매년 수천억원대 안전 투자를 시행하며,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점검 확대, 협력사 금융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은 안전 투장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1658억원에서 2023년 2339억원, 2024년 2773억원으로 매년 안전 경영 투자액을 늘려왔지만, 최근 3년간(22년~24년) 평균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삼성물산은 법정 안전 관리비 외에 '안전 강화비'를 별도로 마련해 총 3379억원을 투입했고, 같은 기간 평균 0.3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DL이앤씨는 최근 3년간 평균 934억원을 투자해 사망자는 점진적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평균 3명 수준이 유지됐다. 대우건설은 매년 안전보건 투자액을 공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350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사망자는 3명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2022년 818억원, 2023년 1189억원으로 2024년 1410억원으로 안전 투자를 매년 확대했다. 올해는 안전투자지원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3년간 평균 사망자는 2.6명으로 나타났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투명하게 투자 금액을 공개하는 업체는 네 곳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업체들도 ESG 지원 협력사 수를 늘리며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닌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 특성상 급작스러운 사고 발생으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은 여전히 어려운 목표라고 입을 모은다. 과도한 제재는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사가 매년 수천억원을 투자해도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퇴출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구조"라며 "현장에서는 오히려 힘이 빠지고, 공적(公敵)으로 몰리는 분위기"라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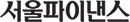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