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중국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가 자율주행 기술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책임 보상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제조사가 기술적 결함은 물론 법적·경제적 책임까지 감수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여전히 규제에 발 묶인 국내 완성차 업계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YD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결함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수리비는 물론 인적 피해까지 제조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책임 보상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사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책임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자사 첨단운전자보조기술(ADAS) '신의 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신의 눈은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 BYD 9000 스마트 칵핏 칩으로 자율주행 레벨2(차량이 조향과 속도를 제어하지만, 운전자가 항시 개입해야 하는 단계)를 지원한다. BYD는 관련 기술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전 차량에 적용하며, 장면 인식 고도화, 정밀 주차, 회피 기동 등을 개선하고 있다. 향후에는 독자 칩 개발을 통한 기술 자립도 제고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을 쥔다는 계획이다.
BYD가 이처럼 기술적 자신감과 함께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전면 책임까지 선언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자율주행을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레벨4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20년 발표된 지능형 커넥티드카 로드맵 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신차 50%에 레벨2~3을 탑재하고, 2030년에는 레벨4 대중화, 2035년에는 레벨5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제도적 기반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11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이후, 지난해 6월 BYD를 포함한 중국 완성차 9사에 대한 자율주행 도로주행 시험을 대거 승인했다. 업체들이 보다 과감하게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 상황은 여전히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기술 실증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도로 주행 시험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운전자 개념, 사고 책임, 보험 체계 등 핵심 사안들 역시 모호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은 2022년 시작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1년만에 중단했고, 자회사 포티투닷도 청계천 일대에서 운영하던 자율주행셔틀 운행을 지난해 말 종료했다.
이달 초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를 찾아 자율주행기술을 직접 체험한 자리에서도 "글로벌 3위 업체의 도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룹 측도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아트리아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카메라와 레이더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독자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그룹 관계자는 "이는 고정밀 지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이 가능한 차세대 자율주행기술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룹은 이 기술을 고도화해 2035년까지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AI·센서 내재화,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실증 인프라 확충 등에 8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도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BYD가 자율주행기술뿐 아니라 책임 보상까지 선언하며 글로벌 표준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사이, 현대차그룹은 제도적 걸림돌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실증 기회를 확대해야 민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주행은 단순한 교통 기술을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 산업"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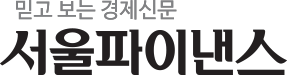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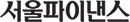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에너지탄소포럼]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9_413212_059_1764126061_2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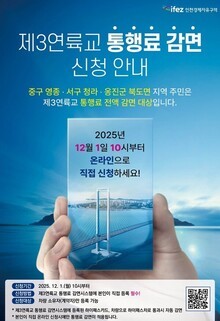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