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오너 3세)은 취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그림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막중한 만큼,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 부회장은 2023년 11월 금호건설 부회장으로 승진했으나,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2002년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해 2018년 아시아나항공 사장 자리에 올랐고, 2021년 금호건설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2년여 만에 부회장 직을 달았으나, 경영 성과는 미흡하다. 2021년 매출 2조650억원, 2022년 2조485억원, 2023년 2조2176억원 수준이었던 매출은 2024년 1조9142억원까지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2021년 1116억원, 2022년 560억원, 2023년 218억원으로 줄다가 2024년 -181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재무 건전성도 빨간불이 켜졌다. 부채비율은 2021년 165.9%에서 2022년 211.25%, 2023년 260.22%로 상승했고, 2024년에는 602%까지 급등했다. 지난해 하반기 빅배스(대규모 손실 처리) 이후 600%가 넘는 부채비율은 589%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이다. 이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720%) 바로 아래다.
박 부회장은 사장으로 승진한 지 5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미등기 이사로 재직 중이다. 미등기 임원은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임원이다. 등기임원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겸업 금지, 자기거래 금지 등 법적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미등기임원인 박 부회장은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롭다.
오너가 3세로 부회장직에 올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휘하면서도 등기를 피하는 행태는, 법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경영 권한만 행사하는 '그림자 경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금호건설은 지난 3월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 붐대에 맞아 숨지고, 2월에는 서울 동북선 도시철도 현장에서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등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오송 참사로 인해 전 대표이사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금호건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사인 코오롱글로벌과 비교하면 금호건설의 위기 대응 방식은 더욱 아쉽다. 코오롱글로벌 역시 고부채(356%)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너 일가인 이규호 부회장이 등기임원으로 공식 경영에 참여하며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주택 수주 확대와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며, 비주택 수주액을 2022년 1조1000억원에서 2024년 2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금호건설의 경영 감시 체계는 취약하다. 이사회는 총 5명(사내 등기이사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경쟁사 △코오롱글로벌 (9명·4명) △아이에스동서 (7명·3명) △동부건설(7명·3명) △한신공영(5명·3명) △계룡건설산업 (8명·5명)와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다. 소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폐쇄성을 심화시키고, 임원 부재 시 경영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박 부회장의 등기이사 등재에 대해 금호건설 측은 "박 부회장이 판단은 하고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선 아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진의 책임 있는 리더십과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박 부회장의 미등기 임원 신분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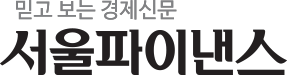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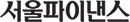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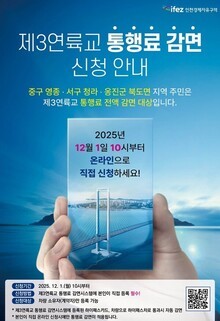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