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삼성전자가 M&A 조직을 새롭게 꾸리면서 정체돼있던 반도체 M&A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확산되는 만큼 여전히 쉽지 않은 분위기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주 새롭게 꾸려진 사업지원실에 전략팀과 경영진단팀, 피플팀 외에 M&A팀이 신설됐다. M&A팀은 기존 사업지원TF의 M&A 인력을 모아 꾸린 팀으로 앞으로 진행하는 M&A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M&A팀장을 맡은 안중현 사장은 2014년 삼성테크윈의 빅딜과 2016년 하만 인수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 인수합병(M&A) 전문가다. 2022년 삼성글로벌리서치 미래산업연구본부를 이끌다가 지난해 4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로 자리를 옮긴 뒤,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를 통해 사업지원실 M&A팀 팀장을 맡게 됐다.
업계에서는 M&A 조직을 새롭게 꾸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M&A 조직은 사업지원 TF 내 담당 인력들이 추진해왔으나 새롭게 팀을 꾸리게 돼 보다 체계적인 M&A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삼성전자의 추가 M&A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의 M&A가 독일 플랙트그룹(냉난방공조), 영국 옥스퍼드시멘틱테크놀러지스(AI), 한국 레인보우로보틱스(로봇) 등 DX부문에 집중된 만큼 DS부문의 M&A도 기대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반도체 M&A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초격차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M&A를 통해 단숨에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경쟁이 국가간 패권 경쟁으로 번지는 만큼 반도체 기업 인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故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는 "유의미한 M&A를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한종희 부회장은 반도체 부문 M&A에 대해 "특히 반도체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인수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대형 M&A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2020년 엔비디아는 영국의 팹리스 ARM의 인수를 추진한 바 있으나 각국의 규제 당국과 경쟁 기업의 반대에 부딪혀 인수에 실패한 바 있다. 또 2017년 SK하이닉스는 미국 베인캐피탈과 일본 기업들로 꾸려진 한·미·일 컨소시엄에 참여한 끝에 도시바메모리(現 키옥시아)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 작업에만 271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AI 붐으로 슈퍼 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시장은 2020년이나 2017년보다 M&A 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여기에 대형 M&A 매물까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반도체 M&A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형 매물보다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업계에 진행 중이거나 시도됐던 M&A는 대부분 반도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텔은 현재 미국의 AI 칩 스타트업인 삼바노바시스템즈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메타는 미국 반도체 스타트업 리보스의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메타는 한국의 AI 칩 팹리스인 퓨리오사 AI를 1조2000억원에 인수하려고 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 밖에 소프트뱅크도 앰페어를 약 9조5000억원 규모에 인수했고 AMD는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브리움을 인수했다.
이들 반도체 스타트업은 대부분 AI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인 만큼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이 거세지는 만큼 여기에 대하 투자도 진행해야 한다. SK하이닉스에 내준 HBM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HBM뿐 아니라 CXL(Compute Express Link), PIM(Processing-In-Memory) 등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에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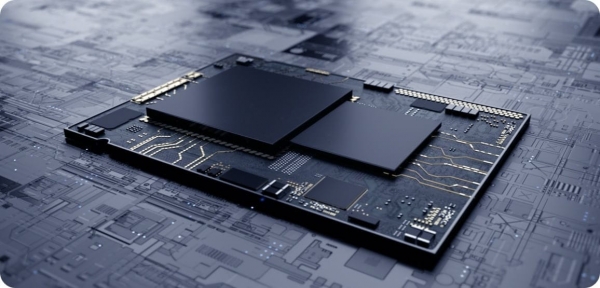
업계에서는 한종희 전 부회장이 올해 3월 주총 당시 "올해 반도체 분야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한 만큼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는 실제 반도체 기업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융합할 수 있는 AI 기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깐부 회동' 이후 GPU 5만장 확보와 함께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을 발표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은 지난달 창립 기념식 당시 "삼성전자 고유의 기술력과 AI 역량을 본격 융합할 것"이라며 "AI를 적극 활용해 고객들의 니즈와 관련 생태계를 혁신하는 'AI 드리븐 컴퍼니'로 도약하자"라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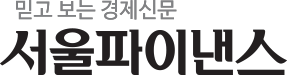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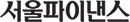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