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이세인 기자] 국내 ETF 시장이 전력 인프라 전 영역으로 투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원자력이나 특정 발전원에 국한됐던 흐름이 최근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송·배전망, 데이터센터, 반도체 후공정 등을 포함하면서, 생산·저장·전송으로 이어지는 전력 밸류체인 전체가 투자 대상으로 부상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KB자산운용은 'RISE AI전력인프라 ETF'를 통해 송배전망·ESS·반도체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종합 인프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앞서 NH-Amundi자산운용은 'HANARO 전력설비투자 ETF'를 통해 변압기, 케이블 등 전력설비 투자에 초점을 맞추며 국내 전력망 강화와 노후 설비 교체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AI전력핵심설비 ETF' 상장을 통해 3일 만에 400억원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시장 반응을 이끌었고,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따른 전력 설비 투자를 전면에 내세웠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글로벌AI전력인프라액티브 ETF'를 통해 해외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까지 투자 범위를 넓히며 글로벌 인프라 테마를 공략하고 있다.
전력 인프라 ETF 시장 확장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장된 ETF들은 발전뿐 아니라 ESS와 송배전망까지 포괄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 테마 ETF와 차별화된다"며 "송전 장비 기업부터 배터리 기업까지 함께 담으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을 줄이고 성장 모멘텀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에는 정부 정책도 뒷받침된다. 한국전력은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통해 오는 2038년까지 72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지난해부터 2028년 5년간 배전망 확충에 10조2000억원을 집행한다. 더불어 RE100 확산과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규모가 2024년 250억달러에서 2032년 114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와 맞물려 전력 설비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ETF 자금 흐름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시장 반응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원자력·전력 인프라 ETF들은 활발한 자금 유입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RISE 글로벌원자력 ETF'가 순자산 3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최근 3개월 20.81%, 6개월 88.69% 수익률을 기록했다. 'SOL 미국원자력SMR ETF'는 상장 세 달 만에 순자산 2000억원을 돌파했고, 상장 이후 수익률 77.57%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리스크 우려도 제기한다. 전력 인프라 투자는 장기 프로젝트가 많아 정책 추진 속도나 원자재 가격에 따라 성과 변동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테마성 ETF와 같은 단기 자금이 몰릴 경우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정책 방향이나 차세대 배터리 기술 변화, 환율·금리 환경 등도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력 인프라는 발전·저장·송전이 맞물려 움직이는 산업"이라며 "ETF 시장에서도 특정 섹터가 아닌 종합 인프라 투자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지만, 투자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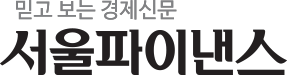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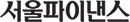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시흥소식] 시화방조제 자전거길에 '디자인 태양광발전' 조성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651_413161_1154_1764076314_2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