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 줄며 조선업계에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모양세다.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선방했지만, 중형 조선사들은 사실상 수주가 끊기며 산업 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244만CGT(82척)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기록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38만CGT(57척, 점유율 57%)를 수주하며 1위를 지켰고, 한국은 56만CGT(8척, 점유율 23%)로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월간 점유율의 변화다. 한국은 전월보다 27% 늘며 점유율이 15%에서 23%로 확대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38% 감소하며 점유율이 19%포인트 줄었다. 특히 한국은 척당 평균 7만CGT의 대형 선박을 수주해 중국(척당 2만4000CGT)의 약 3배 규모를 기록했다. 수량에서는 밀렸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누계 기준으로도 감소세는 뚜렷하다. 올 1~8월 글로벌 발주량은 3448만CGT(1912척)로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891만CGT(251척, 점유율 26%), 중국은 1396만CGT(872척, 점유율 40%)를 기록했다. 수주잔량은 중국이 9992만CGT(61%)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3452만CGT(21%)로 1년 전보다 477만CGT 줄어 대조를 이뤘다.

조선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형 조선사는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력을 앞세워 나름의 선방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형 조선사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중형 조선사 수주량은 15만CGT로 전년 대비 72% 급감했다. 수주액도 2억9000만달러(약 4000억원)로 1년 전보다 81% 감소했다. 케이조선이 수주한 탱커 6척이 전부였고, 대한조선, 대선조선, HJ중공업은 수주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수주액에서 중형사 비중은 0.8%에 그쳤으며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수주잔량도 약 2년 치에 해당하는 168만CGT(63척)에 불과하다. 연구소는 중형 조선업이 재무적·구조적 한계로 기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생존이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대형 조선사가 2년 이상 쌓인 수주잔량과 친환경·고부가 선종을 무기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형 조선사는 주력 물량 발주와 가격 경쟁에서도 중국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기술 투자 여력 부족으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도 뒤처지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조선기자재 산업 기반과 설계·생산 역량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 정부와 민간이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금융 지원 등 취약 부문을 보완한다면 회생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에서 중소형 상선 및 해군 함정 MRO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중형 조선사의 역할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마스가(MASGA) 지원 위한 기술협력센터 설립 및 중소 조선사 MRO 역량 강화 등에 708억원, 선수금 환급 보증(RG) 2000억원을 공급에 대한 안건을 포함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중소형 조선사를 아우르는 정책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조선 능력은 대형 조선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비상 상황에서 중소형 조선사의 수요가 더 클 수 있다"며 "중소형 조선산업은 선박 기자재의 수요를 창출해 관련 산업을 유지 및 발전시켜 대형 조선사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는 선순환적이 결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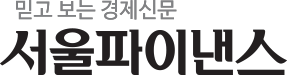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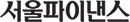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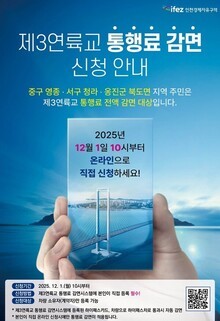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