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최근 건설투자 부문의 부진이 대출규제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지역불균형이나 고령화 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 때문에 대형 토목공사 진척 등에도 건설투자 부문의 회복세는 더딜 것이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단기 부양책이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은행 조사국 경기동향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9월)'를 통해 "최근의 건설투자 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p) 상향하는데 그쳤다. 민생지원쿠폰과 반도체 수출 호조, 예상보다 적은 관세 영향 등의 다수의 긍정적 요인에도 올해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동향팀은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 건설투자 부진을 경기적·구조적 요인으로 나눠 점검했다.
먼저 경기적으로 보면 건설투자는 2013~2017년 중 완화적 금융여건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같은 정부 정책 영향으로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국면을 보였다. 다만 2017년 이후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금융여건 긴축 등으로 장기간 하강국면을 지속해왔다.
2020년대 들어서는 팬데믹 초기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일시 반등했지만, 이후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수주·착공이 위축되고 부동산 PF가 부실화됨에 따라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됐다.
최근에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나 다수의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따른 공사 차질 같은 이례적 요인들도 부진 요인으로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의 건설투자 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수도권은 높은 주택수요에도 토지 부족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수요 부진으로 미분양 주택 누적되고 있다.
비주택 건설투자 제약도 언급된다. 기초 인프라 수요 충족으로 인한 토목건설 감소세 지속, 상업용 부동산 공급과잉, IT기업의 R&D 등 무형자산 투자 증대 등이 부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온라인 중심 소비 전환 등으로 수요가 위축됐으며, 과거 느슨한 규제 하에서 실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확대된 결과 최근 구도심과 신도시에서 높은 상가 공실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 역시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핵심 주택매입 연령층인 30~50대의 인구 비중이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 전환됐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주택수요의 총량은 기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준빈 조사국 경기동향팀 과장은 "향후 건설투자는 불확실성 완화와 대형 토목공사 진척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구조적 하방요인이 지속되면서 그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과장은 "단기 부양책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집중과 금융불균형 누증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켜 오히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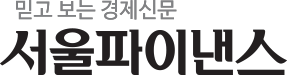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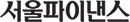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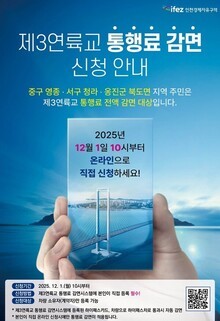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