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지방 상업시설은 인구 감소와 온라인 소비 확산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방의 중대형 상가는 서울 주요 상권과 달리 임대료 하락세가 뚜렷하고, 공실률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역별 중대형 상가 공실률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실률은 2024년 3분기 12.73%에서 2025년 2분기 13.39%로 상승했다. 이는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세종(26.72%) △충북(20.18%) △경북(18.96%)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대구의 경우 작년 3분기 15.47%에서 올 2분기 17.41%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임대료는 전국 평균 1㎡ 당 2만6500원로 큰 변동은 없었으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서울은 5만4760원에서 5만5380원으로 소폭 상승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반대로 △인천(-0.26%) △광주(-0.20%) △대구(-0.15%) △경기(-0.14%) △강원(-0.13%) △충북·경남(-0.12%)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상가 입점 촉진,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보다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상권 붕괴 방지, 창업 보조금 지급, 공동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실 해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서울은 집중된 인구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휴 상업시설 전수조사 및 맞춤형 재개발·재생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과거 사업성 위주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지역 효율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상가 공급 과잉과 공실 누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중장기 전략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세제를 활용한 소비자 유입 장려, 인건비나 배달료 지원, 상가 임대료 인하, 창업 지원금 등 재정 투입 위주의 획일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단기 처방에 그칠 뿐, 공급 과잉과 구조적 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지역별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전략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상가·오피스 공실이 방치될 경우 개인과 국가 모두 심각한 자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핵심 상업 부지에는 용도 규제를 완화해 주거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도심지, 지방의 산업단지, 대학가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 방치되고 있다"며 "입지가 좋은 상가와 오피스 빌딩을 원룸이나 투룸 등 주택으로 개조하면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전환된 만큼, 앞으로도 상가 공실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특히 입지 좋은 지방 대형 상가의 경우 상가 운영을 지속하기보다는 부지를 매각하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업무 복합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경영상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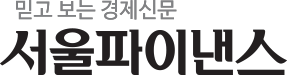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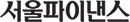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에너지탄소포럼] 배정한 에코링커스 대표 "탄소 크레딧, 개발 기준 표준화 필요"](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14_413215_620_1764126381_220.jpg)
![[에너지탄소포럼]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9_413212_059_1764126061_2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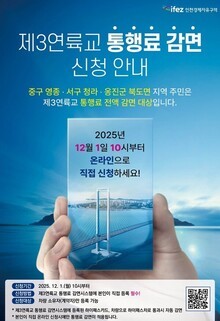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