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현장 누적 수주액이 1조달러를 기록했다. 해외 첫 수주 후 60여 년 만에 달성한 기념비적인 성과다. 다만 지난해 기준으로 중동 지역 수주액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시장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누적 수주액이 1조 달러(약 1468조원)를 넘었다. 이는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처음 수주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그동안 해외건설은 중동 및 아시아 등 강세 지역에 집중돼 왔다. 같은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만 80% 이상 수주가 이뤄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금액이 누적 1775억5000만달러(1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UAE(844억7000만달러·8.4%), 쿠웨이트(488억8000만달러·4.9%), 싱가포르(481억7000만달러·4.8%), 베트남(481억3000만달러·4.8%) 순이었다.
역대 수주 실적 또한 중동 및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집계됐다. 역대 수주액이 가장 많은 프로젝트(단일 기준)는 2009년 12월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발전소 사업으로, 수주액은 191억3000만달러로 2위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80억3000만달러) 대비 약 2.4배 많다. 지난해 4월 삼성E&A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파딜리 가스 플랜트'는 73억달러로 3위에 올랐다.
해외건설협회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371억1000만달러를 수주했다. 당초 목표 금액인 40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1년(305억8000만달러) 이후 3년 연속 수주액을 증가시켰으며, 지난해(333억1000만달러) 대비 11.4% 증가했다. 특히 2015년 461억달러 수주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수주액을 달성했다.
이 중, 해외건설 최대 텃밭인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중동 지역 건설 수주는 185억달러로, 지난해 전체 해외 수주액의 50%에 달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현대건설이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를 따냈고, 삼성E&A와 GS건설이 파딜리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덕분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중동은 해외건설 진출 초기부터 65년 간 주력 시장이었으며, 건설사 실적이 가장 많고 대규모 플랜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1순위로 생각하는 시장"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 기업들보다도 더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수주를 따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포트폴리오가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한계도 지적된다. 특성상 지형적·종교적·정치적 정세의 변화가 있을 경우, 높은 의존도로 인해 건설사들이 입을 피해가 클 수 있다.
특히, 토목,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진출하기에는 기술력과 레퍼런스 차이로 인해 장벽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지난해 유럽에서의 수주액은 50억5000만달러, 북미·태평양 지역은 46억9000만달러였으며, 이 중 국내 제조사 발주공사의 수주액만 각각 27억1000만달러(54%), 37억6000만달러(8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기존 인프라 사업보다는 원자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의 진출을 추진하며, 진출 지역 다변화도 이뤄졌다. 태양광 발전, 배터리 공장 등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확장도 이뤄졌다. 2022년 이후, 미국 수주액은 171억8000만달러(16.9%)로 2위, 헝가리는 36억9000만달러(3.6%)로 5위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시장 다변화를 강조해왔고, 각 건설사들도 지역별로 중남미 등 신시장을 발굴하고 있으며, 정부의 수주 지원단도 폴란드나 스페인, 체코 원전처럼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인프라 사업에서는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집중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동남아나 중동에 비해 미주와 유럽의 경우 인프라 시설 등 공공사업에서 장벽이 있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모두 소화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가 필요한 중동과 아시아가 주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향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선 태양광, SMR(소형모듈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수요가 많고 협력 기회도 많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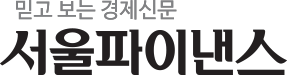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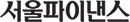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에너지탄소포럼]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9_413212_059_1764126061_2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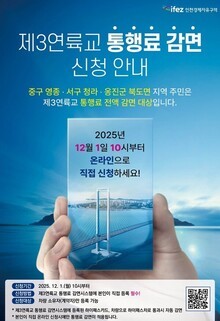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