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트럼프 행정부 1기 이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공급망에서도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글로벌 첨단기술제품(ATP) 공급망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4년) 미국 수입시장 내에서 중국산 첨단기술제품(ATP) 비중은 46.4%에서 16.3%로 무려 30.1%포인트(p)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기술제품(ATP·Advanced Technology Product)은 미국 센서스국(Census Bureau)이 정의한 10대 첨단산업 분야 중, 우리 신성장 산업과 유사한 5개 핵심 분야인 △정보통신 △바이오 △전자 △생명과학 △광학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ATP 수입에서 아세안, 대만, 유럽연합(EU) 등의 비중은 오히려 확대됐다. 이는 트럼프 정부 이후 본격화된 대중 반도체 규제와, 코로나19 이후 미국이 의약품 수입처를 중국에서 EU로 다변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 생산기지가 몰려 있는 아세안과 대만이 중국의 빈자리를 일부 메웠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P 수입시장 점유율이 같은 기간 2.3%에서 4.0%로 1.7%p 늘어났으나, 전자 분야(9.4%)를 제외하면 다른 네 개 부문에서 경쟁력이 낮아 전반적인 비중 확대는 제한적이었다.
보고서는 또,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통해 세계 20개국의 첨단기술제품 공급망 영향력과 연결 능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부상하며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여전히 5대 산업에서 가장 큰 공급망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수출 중심의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세를 넓히는 중이다. 특히 공급망 내 국가 간 연결 능력(매개성) 부문에서는, 중국이 반도체·전기차 등 전자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중국과 교역하는 국가 수가 미국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ATP 공급망의 클러스터 분석에서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양국은 5개 분야 모두에서 별도 클러스터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공급망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대응해, 유럽과는 정보통신·바이오 부문에서, 아시아와는 전자·생명과학·광학 부문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 클러스터에 속한 반면, 전자·생명과학·광학 부문은 중국과 같은 클러스터로 분류돼, 품목별로 협력 대상국이 엇갈리는 구조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EU와는 대부분 다른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만큼, 향후 교역 및 협력 확대의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옥웅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중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흐름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첨단산업의 핵심 공정과 제조 역량을 키우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첨단산업 선도국과 전략적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통상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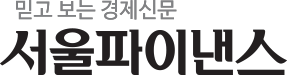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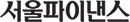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에너지탄소포럼] 배정한 에코링커스 대표 "탄소 크레딧, 개발 기준 표준화 필요"](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14_413215_620_1764126381_220.jpg)
![[에너지탄소포럼]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9_413212_059_1764126061_2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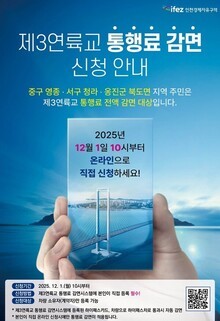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