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자본의 질을 높이라는 금융당국의 엄포에도, 보험사들은 올해 1분기에만 4조6000억원이 넘는 자본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자본 중심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업황 불황과 주주 부담을 고려하면 후순위채 중심의 자본확충 방식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올해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가 총 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오는 26일에는 한화생명이 6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ABL생명이 15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이어 27일에는 현대해상이 8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3개사의 자본증권 발행이 완료되면 올해 1분기 중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증권 규모는 4조6500억원으로, 분기 최대치인 작년 4분기(4조1050억원)를 상회하게 된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자본증권 발행에 열을 올린 이유는 재무건전성 확충을 위해서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 이래 하락한 지급여력비율 제고를 위해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특성을 지닌 자본증권을 활용했단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방안이 당국의 권고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현행 대비 10~20%p(포인트) 하향하는 대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자본이란 보통주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영구적이고 상환의무가 없어 손실발생시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한 자본이다. 반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은 만기가 있고 변동성이 큰 데다, 자본인정 비율이 제한적이라 상대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진다.
앞서 당국은 보험사들의 자본증권 발행이 폭증하며 이자 부담이 가중된 반면,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지급여력비율의 권고치를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추겠단 방침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자본증권 중심의 기존 자본확충 방향을 급히 선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유상증자를 들 수 있다. 유상증자는 기본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지만,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주당순이익이 희석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유상증자시 지분율 유지를 위해 추가 자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과 당국 신고, 공시 등의 복잡한 절차가 발생한다. 제도적 조정 등으로 지급여력비율 제고가 시급한 보험사 입장에서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증자보다 빠르게 자금 확보가 가능한 후순위채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사 주가가 하락한 시점이라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최근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줄줄이 배당을 줄이면서 작년 호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대장주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는 현재 8만4600원, 37만2000원으로 전월 고점 대비 각각 18.3%, 12.5%씩 급감했다.
이처럼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유상증자를 단행할 경우 발행한 주식 대비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후순위채 이자부담이 경감된 점 역시 후순위채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본자본 중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재 자본구조를 단기간내 바꾸기엔 환경이나 조건이 좋지 못하다"며 "기본자본 규제의 윤곽이 드러나면, 그에 맞춰 전략적으로 유상증자 등을 고려할 것 같다. 당장은 후순위채 대비 신종자본증권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정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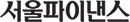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에너지탄소포럼] 배정한 에코링커스 대표 "탄소 크레딧, 개발 기준 표준화 필요"](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14_413215_620_1764126381_220.jpg)
![[에너지탄소포럼]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9_413212_059_1764126061_220.jpg)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