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그동안 낮은 공사비 때문에 중견·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여했던 공공 주택 건설 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자주 얼굴을 비추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공공 주택 사업비를 일제히 올리고 있는 분위기 덕분이다. 다만 대형 건설사가 브랜드와 시공품질을 앞세워 공공 주택 사업마저 독점해 나가는 동안, 건설 경기 침체 속 줄어든 일감에 중소 건설사들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말 '전농 9구역 공공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전농9구역은 전농동 4만9061㎡ 용지에 최고 35층 아파트 1159가구와 근린공원,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 구역은 민간 재개발을 위해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의 문제로 20년 가까이 사업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3월 공공 재개발을 위해 이곳 주민들과 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LH가 총공사비 4400억원(3.3㎡당 780만원 수준)을 제안하자 분위기는 반전됐고, 결국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에 성공했다.
공공 주택 사업은 2023년까지만 해도 서울 기준 사업지들의 평균 공사비가 3.3㎡당 500만원 안팎이었던 탓에, 중견 수준의 건설사들만 간간이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같은 해 말 LH가 공공 주택 공급을 독점하는 게 주택 품질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 주택 사업권을 민간에게도 개방했으나 사업성의 이유로 건설업계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적극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업계에선 민간 정비사업지보다 낫다는 평가도 일부 나온다.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규제 특례를 받고, 빠른 인허가 등 빠른 속도 장점과 사업자금 확보에도 유리해서다.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이곳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의 67%를 차지해 10년 넘도록 재개발 사업에 난항을 겪었으나, 2022년 공공재개발지로 확정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돼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조합분양 740가구, 일반분양 450가구, 공공임대주택 488가구 등을 짓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LH다. 공사비는 3.3㎡당 780만원으로 책정돼 사업비만 7250억원 규모다.
GS건설은 또 현재 중화5구역 사업(LH 시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시공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곳 공사비도 '3.3㎡당 780만원 이하'로 제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공사비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은 일단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기업 브랜드와 시공품질을 확보하면서 공공 재개발 단지는 저렴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도, 공사비 자체도 민간 추진 사업에 비해 상승폭이 어느정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 주택 사업의 공사비 상승 요청도 과거보단 많이 인정되는 추세다.
실제로 DL이앤씨 컨소가 시공하는 '인천검단 AA19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보면 사업계획 수립 당시인 2019년 12월 2173억4006만원에 책정된 공사비를 3401억8557만원(56.5%↑)으로 인상하는 안이 지난달 31일 승인됐다. LH의 '주택건설공사비 지수'가 지난해 하반기 120.46(분양지수 기준)로, 2020년 대비 20.46% 오른 것을 고려하면 위 사업의 공사비 상승분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5·S6·A4 블록 또한 최근 사업비가 1조2608억원으로 기존 9831억원보다 28.8% 늘어났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공사비 상승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이 연달아 승인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3기 신도시 하남교산 A2블록과 남양주왕숙 B1·B2·A3블록, 평택고덕 A-5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 5개 단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부천대장 A5·A6블록은 DL이앤씨 컨소가 수주한 상태다. 이들 입찰에는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했으나 대형 건설사 컨소가 모두 우위를 점했다.
문제는 가뜩이나 부동산 한파 속 줄어든 일감에 중소 건설사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주요 수주 거리를 독점해 가고 있어서다. 지난해는 일부 대형 건설사가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쓰는 동안 중소 건설사의 부도와 폐업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양극화가 심화한 해였다. 매출 회복이 필요했던 대기업들이 과거 중견·중소 건설사의 먹거리였던 지방 주택사업과 공공공사에 마저 관심을 가지면서다.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LH등 공공이 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 기업의 신용등급, 현금흐름능력 등을 강도 높게 책정하는 분위기라 사살상 작은 건설사들의 공공 사업 참여 가능성이 줄고 있다"며 "일부는 대형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에 참여하곤 있지만 컨소시엄 일원이 되기 위해선 특정 지분율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오르면서 이게 최소 몇천억원단위라, 자금 사정이 넉넉한 곳이 아니면 사업에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집값 양극화 커지는데···'똘똘한 한 채' 분위기 계속되나
- "내년이 더 어렵다"···건설업계, 연말 미분양 털어내기 '안간힘'
- [2024 건설 결산] 건설경기 악화에 CEO 교체 승부수···도시정비 실적은 '선방'
- 지난달 건설경기 소폭 상승···"연말 수주 집중 영향"
- LH,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성금 2억원 기부
- GS건설, 부산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준공
- "원전 사업부터 연어 양식까지"···건설업계, 신사업 발굴 속도
- 장기화된 '경기 침체·정세 불안'···건설 빅5, 4분기 실적 '먹구름'
- DL이앤씨-DL건설, 'DL안전보건협의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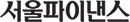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에너지탄소포럼]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9_413212_059_1764126061_220.jpg)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