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일제히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하며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2~3년 전 시작된 건설 경기 침체로 착공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본격화한 탓이다. 건설 경기 악화와 수익성 저하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건설업계는 생존을 위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 능력 평가 상위 7개 건설사의 올해 매출 목표 합계액은 88조8956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대비 8조3624억원(8.6%) 감소했다. 개별 기업들의 목표치를 살펴보면 대다수 건설사가 전년 대비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하향 조정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한 영향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올해 목표치를 지난해 매출보다 2조원 이상 줄였다. 시공 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올해 매출 목표를 15조9000억원으로 제시해 지난해 매출액 18조6550억원보다 2조7550억원(14.8%) 낮췄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3,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 준공이 다가오고, 반도체 시장 불황으로 평택 공장 추가 착공 및 투자 계획이 미뤄진 영향이다.
건설업계 맏형인 현대건설은 지난해 매출 32조6944억원을 달성했으나 올해 매출 목표를 30조3837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가량 감소한 수치다. 현대건설은 작년 한 해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사업 손실에 따라 잠정 1조22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3년 만의 '어닝 쇼크'를 맞았다. 현대건설의 국내외 현장 수도 감소했다. 지난해 1월 기준 200여 곳을 상회했으나, 올해 1월 기준 170여 개로 줄었다.
대우건설은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매출(10조5036억원)보다 2조1000억원 낮춘 8조4000억원으로 발표했다. 7개 건설사 중 가장 큰 감소폭(-20%)이다. 대우건설의 경우 국내 사업장 수가 약 1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착공 현장이 얼만큼 진행되는지에 따라 매출이 잡히는데, 작년과 재작년 수주가 줄어들면서 착공 현장이 많이 줄었다"며 "부동산 시장 불황과 건설업황 위축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올해 매출 목표를 7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매출 8조3184억원 대비 5184억원(6.2%) 낮은 금액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착공한 가구수가 9119가구였으나 올해는 7940가구로 13%가량 줄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주택 경기 악화에 따라 주택 부문 매출이 줄어들었고, 기존 대형 현장은 준공되는 반면, 착공 물량이 줄어 플랜트 비중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GS건설은 지난해 매출(12조8638억원)보다 2638억원 적은 12조6000억원의 매출 계획을 내놨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주택 부문 매출이 1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위자이 레디언트, 메이플자이 등 준공 예정 단지가 늘어나면서 매출에서 빠지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는 올해 매출 목표치를 9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작년(9조9666억원)과 비교해 4666억원(4.7%) 감소한 수준이다. 삼성E&A는 지난해 전체 신규 수주 물량 중 약 3분의 1을 삼성전자 등 관계사를 통해 수주한 만큼, 삼성물산과 함께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진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매출 목표로 4조3059억원을 제시하며, 7개 건설사 중 유일하게 지난해 매출(4조2562억원) 대비 목표를 높였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등 자체사업 준공과 서울원 아이파크 착공,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사업 등 준공이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매출 목표를 낮춰잡은 가운데 건설업계 수익성도 악화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상장 6사의 올해 평균 매출 원가율은 92.2%에 달한다. 100만원어치 공사를 했을 때 건설 자재비와 작업자 인건비 등 원가로만 92만원 이상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현대건설의 원가율은 100.6%로, 회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한 돈이 더 많다. 이어 GS건설(91.3%), 대우건설(91.2%), HDC현대산업개발(90.9%)도 90%를 웃돌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89.4%)과 DL이앤씨(89.8%)도 90%에 육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며 원자잿값이 급등하고,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현장 공사 비용이 크게 늘어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주거용 건설공사비 지수는 129.08로, 3년 전보다 약 27% 상승했다.
건설업계는 국내외 경기와 건설 업황을 고려할 때,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외형 성장보다는 리스크와 수익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는 성적표가 80점만 맞아도 100점을 맞은 것처럼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주택 불황과 탄핵 정국, 중동 네옴시티 계획 전면 수정, 트럼프 2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프로젝트나 사업들도 대부분 투자를 축소하는 등 발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경영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착공 물량은 2009년 글로벌 위기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크게 쪼그라들었고, 그 여파가 가장 크게 오는 시점은 2~3년 뒤로, 올해와 내년까지 착공 물량 감소 여파가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난해 2분기까지 마무리되는 공사들이 많았지만 이후 위축된 착공과 공사 물량으로 업황 자체가 매출 감소 시점에 접어들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하며, 신규 사업이나 착공, 수주, 투자 등의 리스크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 [CEO&뉴스] 첫 해 '합격점' 허윤홍 GS건설 대표, 수익성 개선 박차
- DL이앤씨, 작년 영업익 2709억원···전년比 18% 감소
- 대우건설, 작년 영업익 4031억원···전년比 39% 감소
- GS건설, 작년 영업익 2862억원 '흑자전환'
- '1.2조 적자 쇼크' 현대건설·현대ENG, 신임 대표 리더십 시험대
- GS네오텍, 신세계건설 시공 우수 파트너사 선정
- 삼성물산, 송파 대림가락 재건축 시공사 선정
- 현대건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최고 디자인상
- DL이앤씨, '아크로 삼성' 준공
- 삼성물산, 업사이클링 굿즈로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 강남도 예외 없다···정비사업 수주전 '몸 사리는' 건설사들
- 4월 제조업 전망지수 3개월만에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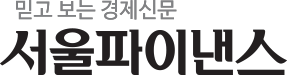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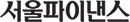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에너지탄소포럼]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9_413212_059_1764126061_2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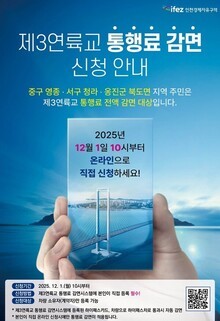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