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기관투자자의 단기 매매(단타)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공개(IPO) 개선책으로 인해 증권사들은 다소 난감한 분위기다. 기관투자자의 의무확약 물량에 따라 떠안아야 할 공모주가 또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장 주관사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 중 증권사가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기관투자자의 확약 물량이 40% 미만일 경우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하고, 이를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은 코스피 48%, 코스닥 16%로, 평균 19%에 불과했다.
이미 코스닥 시장에는 비슷한 규정이 존재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주관사는 모집·매출 주식의 3%(상한 10억원)를 3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는 의무확약 물량이 적을 경우, 코스닥 시장에 도전하는 상장사의 주식 1%를 추가로 6개월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2023년 말에는 기술특례상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주관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부실화할 경우,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을 부과하는 방안도 이미 마련됐다. 이 경우 보호예수 기간 역시 6개월로 설정된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주관사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공모가는 주관사와 기관투자자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가를 낮추기 위해 주관사가 노력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는 의무보유 확약 물량 기준을 30%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40%로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창 KB증권 ECM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의무보유 확약 등이 강화되면 주관사는 보수적으로 IPO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이 감소하면서 모험자본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IPO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관사의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기업들에 헐값으로 IPO를 하라는 것처럼 들린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IPO 시장이 과열됐지만,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공모가 상단과 하단이 동시에 나오면 시장의 기능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런 변화구가 나오면 다시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증권사에서 IPO 자체를 피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가 줄어들 수 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사실상 1인이 운영하는 투자일임사가 IPO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는 시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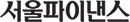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에너지탄소포럼] 배정한 에코링커스 대표 "탄소 크레딧, 개발 기준 표준화 필요"](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14_413215_620_1764126381_220.jpg)
![[에너지탄소포럼]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9_413212_059_1764126061_220.jpg)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