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면서 중국 제조 기업들의 한국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반중(反中) 정서로 인해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알리와 테무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샤오미테크놀로지코리아(샤오미코리아)는 오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에 판매할 제품을 공개하며 상반기 중 오프라인 매장도 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샤오미는 국내 총판 업체를 지정해 일부 스마트폰과 가전 기기를 판매해왔다.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으며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정식 매장을 연 적은 없다.
샤오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 알려지진 않았으나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노트북, 로봇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모바일 기기와 가전 등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샤오미가 전기차 SU7까지 국내에 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23년 출시된 SU7은 3가지 모델로 이뤄져 있으며 CATL의 배터리와 TCL, BOE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샤오미와 함께 중국 최대 완성차 업체인 BYD도 국내에 진출한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BYD는 16일 인천에서 한국 시장 진출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BYD는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점유율 1위에 올라선 저력을 가진 회사다.
앞서 BYD는 세일즈·서비스를 담당한 딜러사 6곳을 선정하고 금융상품 마케팅 강화를 통한 세일즈 네트워크 기반을 다지고자 우리금융캐피탈과 금융업무 제휴를 맺는 등 국내 진출 채비를 진행했다.
BYD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제주 등 전국에 전시장을 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BYD는 한국에 출시할 구체적인 모델에 대해 공개하진 않았으나 저가 제품 위주의 전략은 펼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BYD 측은 "중국 내 판매가가 6만9800위안(약 1400만원)인 시걸은 한국에 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2023년 11월 한국 법인을 설립한 TCL도 판매처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TCL코리아는 그동안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해왔으나 최근 롯데하이마트, 코스트코 등 오프라인 판매 채널도 확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파르나스몰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기도 했다. TCL코리아 측은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직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스마트폰과 가전, 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잇달아 진출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반중 정서가 거세고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애플 조차 국내에서는 20% 내외의 점유율에 머무르며 고전하고 있다. 그동안 샤오미는 가성비 폰을 앞세워 국내 알뜰폰 시장을 공략했으나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 100만원대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되더라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V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삼성과 LG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란히 1, 2위를 수성하고 있다.
전기차는 안전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중국산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례 전기차 기획조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일반 소비자, 전기차 보유자, 전기차 구입의향자 각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약점'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 61%가 '성능·품질 부족'을 언급했다. 또 '고객 사후관리'와 '생산·조립 과정'에 대한 불신이 각각 47%, '원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42%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산 전기차의 강점'을 묻는 의견에는 '저렴한 원자재 공급능력'(58%)과 '우수한 가성비'(44%) 등의 대답이 많았다.
반면 알리와 테무가 성공을 거둔 만큼 중국 제품에 대한 반감도 이전과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최근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지출을 줄이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만큼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제품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TV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 2위를 수성하고 있지만, TCL이 3위를 유지하며 2위 LG전자와 격차를 좁히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점유율(매출 기준)은 28.7%, LG전자의 점유율은 16.5%였다. 이어 3위인 TCL은 12.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특히 TCL과 하이센스 등 중국 기업의 합산 점유율은 22.0%로 전년 동기 대비 2.3%p 늘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합산 점유율은 45.2%로 전년 동기 대비 1.9%p 줄어들었다.
이 같은 중국 제품의 강세가 국내 시장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테무와 알리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12월 기준 899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2위다. 테무도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지난달 813만명의 MAU를 확보해 11번가를 제치고 3위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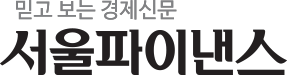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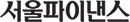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에너지탄소포럼] 배정한 에코링커스 대표 "탄소 크레딧, 개발 기준 표준화 필요"](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14_413215_620_1764126381_220.jpg)
![[에너지탄소포럼]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9_413212_059_1764126061_2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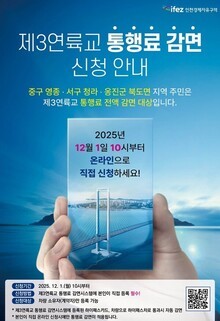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