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홍콩) 박조아 기자]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지만 홍콩법인이 아시아 지역 한국투자증권의 모든 거점을 묶는 중간지주회사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명 한국투자증권 홍콩법인(Korea Investment & Securities Asia, Ltd.) 법인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서울파이낸스와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1980년생인 주 법인장은 지난 2023년부터 한국투자증권 홍콩법인을 이끌고 있다.
주명 법인장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KIS인터내셔널(International)로 아예 본사와 해외 비즈니스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2034년이나 2035년에는 최소한 KIS인터내셔널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증권사는 본사에 있는 본부가 해외 현지법인들의 여러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예컨대 IB본부가 IB인력들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사에 너무 의존적으로 가기 때문에 경험상 확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홍콩법인은 지난 1997년 진출한 이후 투자금융(IB), 트레이딩, 에쿼티 세일즈 등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몽골 국책 주택금융기관 '몽골리안 모기지 코퍼레이션(Mongolian Mortgage Corporation)' 달러채 발행을 주관했고, 7월에는 필리핀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스타랜드(Vista Land & Lifescapes Inc.)의 5000만 달러(약 690억원) 규모 글로벌 본드 발행을 주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 법인장은 "한국 증권사가 수출입은행 등에 발행하는 채권에 주관사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한국투자증권은 2023년 말에 외사 출신의 CS인력 두 명을 채용해 채권자본시장(DCM)을 시작했는데, 올해 여기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이 기능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 법인장은 홍콩 시장의 매력포인트로 조세 환경을 꼽았다. 홍콩은 법인세 구조가 단순하고 낮은 편으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에 좋다. 법인세를 살펴보면, 한국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것과 달리 홍콩은 싱가포르(17%)보다 낮은 16.5%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판매세, 자본이득세, 부동산세 등이 없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홍콩의 시장이 위축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일축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에 45조 규모였던 홍콩IPO 시장은 지난해 6조원으로 위축됐지만, 올들어 다시 살아나면서 10조원, 20조원 시장으로 가고 있다"며 "IPO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홍콩에 온지는 11년이 됐고 2023년부터 홍콩법인장을 맡아오고 있는데, 증권사 입장에서 비즈니스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 '위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홍콩은 나쁜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홍콩 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 나라에 8개의 법인을 두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동경 등 2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 법인장은 현재 한국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중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베트남이며, 홍콩 법인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2030년까지 모든 수익의 30% 정도를 해외에서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선 골고루 성장을 해야 한다"며 "홍콩 법인은 아시아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APAC(아시아·태평양)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주 법인장은 "제 세대에서 JP모건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지만, 노무라증권이나 다이와 증권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이와증권의 자기자본이 한 30조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0조원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2~3배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그 정도면 좀 해볼만 하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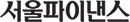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에너지탄소포럼]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9_413212_059_1764126061_220.jpg)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