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했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를 9년 만에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IMA 1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조건을 초과 달성한 상황이라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IMA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1분기 내로 발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IMA란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객 예탁금을 기업 대출, 회사채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
지난 2016년 도입된 IMA는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심지어 발행 어음과 달리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한도 규제가 없는 상품이라 증권사 입장에서 또 다른 자금 조달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도입된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IMA가 허용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그동안 제대로 된 시행 세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IMA 개선 방안을 1분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IMA 신청 조건은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겨야 가능한 데, 현재 이를 충족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뿐이다. 지난해 3분기 말 별도 기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각각 9조7909억원, 8조8719억원이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IMA가 도입된 첫 해에 이미 자기자본 조건을 충족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기자본 8조원을 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뿐이라 공정위로부터 독점 체제 우려도 있었을 것"이라며 "또한 IMA 제도 허용에 대해 은행 측의 반대도 컸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이 8조원을 넘어섰다.
금융 당국이 IMA 제도 개선에 나서더라도 자기자본 8조원이라는 기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IMA 제도와 관련해 자기자본 8조원이라는 신청 기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제나 리스크 관리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IMA가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IMA는 손실 부담에 대한 위험을 증권사가 모두 지는 구조라 증권사 재무 건전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두 회사가 1호 선점을 놓고 경쟁할 수 있어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개의 회사를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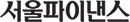

![[에너지탄소포럼] 배정한 에코링커스 대표 "탄소 크레딧, 개발 기준 표준화 필요"](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14_413215_620_1764126381_220.jpg)
![[에너지탄소포럼] 강민구 변호사 "한국 VCM, 지원 중심 입법이 시급"](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9_413212_059_1764126061_220.jpg)






![[광명소식]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선정 등](https://cdn.seoulfn.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613704_413206_721_1764122841_220.jpg)
